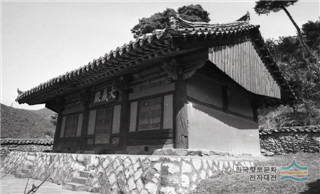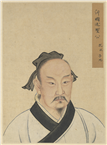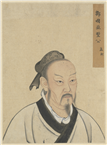부수 검색
한자목록
한글음가 선택
한자목록
사각호마 검색
한자 목록
한어병음 검색
한자 목록
코드 검색
한자 목록
옛한글 검색
옛한글 목록
옛한글 입력기는 자모 입력순에 따라 조합되어 표시됩니다.
※ 키보드로 입력할 수 없는 낱글자는 다음과 같이 입력할 수 있습니다.
| 옛한글 | 입력방법 | 옛한글 | 입력방법 |
|---|---|---|---|
| ㅿ | Shift+ㅁ(또는 ㅁ.) | ㆁ | Shift+ㅇ(또는 ㅇ.) |
| ㆆ | Shift+ㅎ(또는 ㅎ.) | ᄼ | Shift+ㅋ(또는 ㅋ.) |
| ᄾ | Shift+ㅌ(또는 ㅌ.) | ᅎ | Shift+ㅊ(또는 ㅊ.) |
| ᅐ | Shift+ㅍ(또는 ㅍ.) | ᅔ | Shift+ㅠ(또는 ㅠ.) |
| ᅕ | Shift+ㅜ(또는 ㅜ.) | ㆍ | ㅏㅏ |